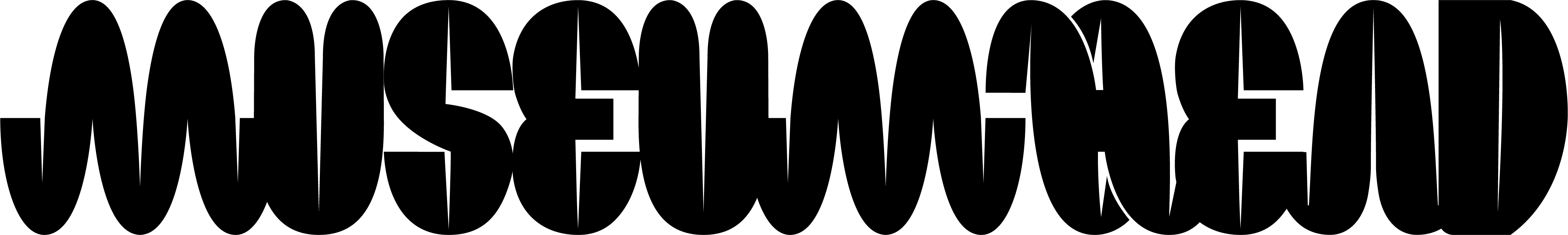《L. Practice》
이혜인 개인전
2022.09.28.-11.05.
글 | 권혁규
기술협력 | 박정현, 김성학
설치 | 스튜디오 가가구죽
도움 | 김한울, 이민경, 김승겸, 주혜인
기획 | 뮤지엄헤드
《L. Practice》
Hyein Lee
28.SEP-05.NOV.2022.
Text | Hyukgue Kwon
Technical Support | Jeong-Hyeon Bak , Seong-hak Kim
Artwork Installation | Studio GAGAGUZOOK
Thanks to Hanul Kim, Minkyung Lee, Seung-kyum Kim, Hyein Ju
Curating | Museumhead
이혜인은 날씨를 확인한다. 오랫동안 야외에서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날씨는 전념의 대상이 되곤 한다. 날씨는 작업 도구가 담긴 수레를 끌 수 있는지, 땅에 천을 깔 수 있는지, 붓질을 하거나 스프레이를 뿌릴 수 있는지 등 그림의 자리와 시간, 상태를 결정하는 지표이며, 그림의 거의 모든 것이었다. 그날의 빛과 온도, 습도는 작가의 호흡, 신체 움직임과 함께 했고, 그림의 형태와 색을 포함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의 형편을 결정했다.
그리고 날씨는 확인할 수 없다. 그날의 날씨는 일기예보의 얄궂은 기호들이 알려주는 기온, 풍향, 풍속, 강수량 등의 정보로 완전히 파악되지 않는다. 어느 맑은 날은 쏟아지는 햇빛을 멀쩡히 받아내기 힘들고 또 어느 날은 모든 게 선명하게 보인다. 논길은 건조한 날에도 말랑말랑하다 못해 발이 푹푹 들어갈 정도로 질고, 멀쩡한 하늘을 보고 나간 날에도 소나기를 만나 터덜터덜 돌아오기 일쑤다.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의 순간들은 정해진 방향도 패턴도 갖지 않는다. 다채롭지만 유사하고 순간적이지만 계속된다.
예측 불가능성은 날씨를 지극히 개인적이고 경험적인 것으로 돌려놓는다. 기분에 따라 깨끗한 하늘도 한없이 무겁고 우울하게 느껴지고, 도로를 지나는 차들의 소음이 유난히 신경질적으로 들리는 날이 있는가 하면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연신 그림만 그리다 온 날도 있다. 날씨는 종종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무언가를 아주 민감하게 인식하도록 한다. 그렇게 절대 고갈되지 않는, 지루해질 수 없는 날씨는 그림 그리기가 얼마나 종합적이며 동시에 우스운 일이 될 수 있는지 말해준다.
이런 이유로 이혜인은 날씨를 따르는 지도 모른다. 작가는 분명 그리기 위해 야외로, 특정 장소로 나가지만 눈앞의 풍경을 재현하지 않는다. 대상의 재현이 불가능한 계획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작가가 그곳에 가는 이유는, 마치 날씨를 경험하듯 풍경의 틈새를 밀고 나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주하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그의 작업은 정해진 절차의 수행이 아닌 변수와 혼란의 수용과 적용 혹은 그것에 대한 저항이고, 그려진 풍경은 특정 장소의 지시가 아닌 개인적인 경험과 정서, 기억에 집중한 결과이다. 그림 속 그날, 그곳엔 작가가 과거에 찾았던 어느 장소, 우연히 스친 사람 등과 같이 정해진 시공을 초월한 상념과 기억들이 함께한다. 보이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이 뒤섞인 화면 속 그곳은 분명 존재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그곳은 특정 장소와 상황에 반응하고 경합하며, 또 연상한다.
그럼 작가가 찾은 장소는 어디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림 속 그곳이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개인의 내면 어딘가에 더 가깝다면 작가의 작업을 설명해온 사생의 개념은 어떻게 재고될 수 있을까. 이번 개인전《L. Practice》에서 작가는 야외로 나가길 중단한다. 대신, 야외 환경을 일종의 데이터로 전환한 장치를 통해 야외에서의 경험 자체를 일부 자동화하며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개인의 상념에 집중해 본다. 예를 들면, 작가는 날씨(맑음, 흐림, 비, 눈)를 색과 시간의 시퀀스로 표현하기 위해, 위도와 경도를 입력하면 나타나는 특정 지역의 날씨 데이터를 RGB 컬러로 전환하는 LED 조명 장치를 설치한다. 그리고 이를 가상의 야외 환경으로 인지하며 작업을 진행한다. 같은 맥락에서 발 딛는 땅의 촉각과 닮은, 실제 그리기의 장이 되는 진흙 단지를 만들고, 그곳에서의 몸의 움직임을 소리로 전환하여 연주하는 드럼 세트도 구상해 본다. 야외 작업의 조건이라 할 수 있는 빛, 소리, 촉각 등을 실내공간에서 가상적으로 경험하며 그것으로부터 파생, 분열되는 보이지 않는 풍경을 전면화하려는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경험을 간소화된 장치로 대신해 본다는 작가의 허무맹랑한 시도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이번 개인전의 전제가 되는 이 인위적 체험의 장은 그리기의 환경뿐 아니라 그리는 행위 자체를 일종의 자동 프로그램으로 설정하는 듯하다. 앞서 설명했듯, 보이는 풍경과 볼 수 없는 개인의 풍경이 뒤섞이는 작가의 작업에서 그리기의 계획과 의지는 무효가 되기 마련이다. 그리기는 자연스럽게 주변이 아닌 개인에, 외부가 아닌 내부 감각에 동요되는 것이다. 작가가 고안한 장치는 그동안 자신의 그리기가 특정 환경과 상황에서 진행되었지만, 사실 외부적 요인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심지어 자동적인 발생이 아니었는지 자문한다.
실제로 작가는 장치화 된 환경에서, 아니 환경이라는 게 거의 부재한 상태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장소와 시간을 초월한 장면과 기억을 떠올리게 되고 그에 따라 그리기를 실행한다. 야외가 아닌 작업실에서 내부와 외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화를 망설임 없이 그려내는 것이다. 일례로, 전시에 포함된 <폐허에 사는 남자_메르겐탈러링 작은정원구역, 흐림>(2022)은 10년 전 작가가 독일 거주 중 방문했던 재개발 지역의 폐허와 그 앞에서 스친 남자를 떠올리며 그려진다. 또, <목수의 시간>(2022)은 유년 시절 기억으로 자리한, 2008년 개인전 《비정한 세계》의 주요 테마라 할 수 있는, 할아버지의 목공소를 재방문한다. 해당 작업은 작가의 2008년 작 <목수의 시간>과 부분적으로 닮아있다. 이 밖에도 전시의 작품들은 과거 작가의 집에서는 보이던, 전철이 생기며 사라진 사시나무가 있는 풍경, 능곡의 기찻길 등 기억에서 쉽사리 떠나지 않는 장소를 소환한다. <바닥을 보는 남자>(2022)와 <마지막 그림>(2022) 같은 작업은 움직임과 속도의 붓질로 어떤 존재와 분위기, 혹은 그것의 각인과 흔적을 반자동적으로 나타낸다. 그렇게 그려진 풍경과 그 안의 인물들, 구체적인 형상으로 포섭되지 않은 그리기는 특정 대상을 재현한 이미지라기보다 아주 오랫동안 개인 안에서 축적된 존재의 기억이자 구성물로 다가온다.
전시가 설정한 프로그램은 분명 무언가로의 ‘반복적 복귀’를 실행하는 듯하다. 작가는 작업 초창기부터 어딘가로 ‘되돌아가길’ 시도해왔다. 그가 날씨를 확인하고 부지런히 찾아간 그곳은 변화무쌍한 현재가 아닌 사라진 장소의 기억이었는지 모른다. “나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시작할 수 있을까?”, “그때 느꼈던 것을 지금도 느끼고 알아볼 수 있을까?” (작가노트, 2010년), “십 년 전의 들판 그림들을 같은 장소에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작가노트, 2020년). 반복되는 돌아감의 소원은 2018년 개인전 《Sync》에서 과거 작업의 일부를 가져와 다시 그리는 등 다양한 방법론적 실험으로 이어졌다. 이번 개인전 《L. Practice》의 프로그램 역시 특정 시공의 환경과 경험을 편리한 기호로 전환, 취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거듭된 시간 속에서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무언가를 드러내 확인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L. Practice》는 그리기와 자동 프로그램을 교차시킨다. 전시장에 회화와 함께 놓인 LED 조명을 포함한 몇몇의 도구, 장치의 흔적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완벽하게 재현된 장소가 아닌 그것의 이면, 개인의 경험과 기억, 저 깊은 곳의 성질을 상상하도록 한다. 그린다는 건 결국 외부 요인이 아닌 자기 안에 체화된 무엇과 더욱 밀접하게 연루되는 일이라고 전시는 말한다. 그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전시장의 불빛은 무수히 많은 순간들이 침투 축적되며 결국엔 자동화된 발생으로서의 그리기를 비추는 스크린이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수행(practice)의 제목이 된 문자 ‘L’은 장소와 감정, 그리기와 기억 등 많은 것을 가리키지만, 완벽하게 풀이되지 않는 추상 기호로 자리한다. 이번 전시가 쓰게 될 “이혜인은 날씨를 확인했다”라는 과거형 문장은 작가가 특정 대상/자연/인물과의 불화를 전면화하며 자기 안의 세계에 집중하게 됐음을 알리게 될까. 자동 발생적인 그리기의 실험은 그간 이혜인 작업을 설명해온 사생의 개념을 뒤집으며 자율성과 추상의 영역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게 될까. 이혜인은 자기 회화의 역사에서 분기점이 될 만한 지금 이곳을 어떻게 지나고 또 되돌아볼까.
기획/글 권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