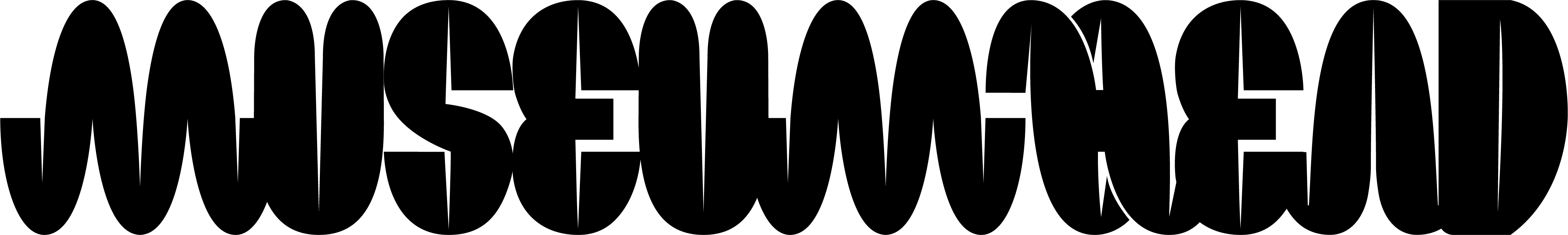《square_bi:tjlfhgadfdagggg》
최수정 개인전
2023.7.12.-8.12.
12:00-19:00 (일요일, 월요일 휴관)
서울시 종로구 계동길 84-3, 1층
기획, 글 l 권혁규
그래픽 디자인 l 김영삼
주최, 주관 l 뮤지엄헤드
후원 l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
𝘴𝘲𝘶𝘢𝘳𝘦_𝘣𝘪:𝘵𝘫𝘭𝘧𝘩𝘨𝘢𝘥𝘧𝘥𝘢𝘨𝘨𝘨𝘨
Choi Soo Jung
2023.7.12.-8.12.
12:00-19:00 (closed on Sundays, Mondays)
Museumhead, 1F, 84-3, Gyedong-gil, Jongno-gu, Seoul
Curated by Kwon Hyukgue
Graphic Design | Sam Kim
Organized by Museumhead
Sponsored by Seoul,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죽음은 부재를 말하지 않는다. 묘지에는 사람들의 발걸음과 꽃다발이 모이고, 꿈틀거리는 자연에 불쑥 더해지는 후회와 그리움, 어떤 염원과 소망이 함께 한다. 어쩌면 죽음은 거칠게 동요하는 실재에 의해서만 인지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부재와 실재가 뒤엉켜 있는 상태, 여러 기억과 감정, 현기증 나는 흔들림과 그 잔상의 카니발이 바로 죽음일지 모른다.
최수정 개인전 《square_bi:tjlfhgadfdagggg》는 이러한 죽음을 떠올린다. 전시는 자연사박물관에서 볼 법한 장면을 화면에 옮긴다. 살아있음을 재현한 죽은 것들, 박제들과 연출된 자연, 죽음(혹은 생)의 연극적 상황이 그려진다. 분명한 가상이지만 실재하는 것들, 눈에 보이지만 이미 죽은 것들을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죽음은 회화라는 매체와 포개진다. 회화는 그것의 오랜 역사가 실토하듯 죽음의 현시에 동참해왔다. 네모난 틀 속 납작한 화면에 안착된 이미지는 가상의 무대, 시각적이고 정서적인 환영을 만들어 냈고, 존재가 명백하지 않은 대상과 서사, 감각과 분위기를 가시화했다. 최수정의 이번 전시는 이처럼 오랫동안 죽음에 연루된 회화와 그 대상을 함께 호명하며 그만의 축제, 카니발을 벌인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축제는 신기루에 가깝다. 분명하게 발음할 수 없는 전시 제목처럼.
전시는 동일한 크기의 신작 회화 열 점으로 이뤄진다. <1>, <2>, <3>, <4>로 이름 지어진 작품은 다시 공간에서 <1>, <1>-<2>, <1>-<2>-<3>, <1>-<2>-<3>-<4>로 자가 증식, 혹은 분열하며 전시된다. 이러한 구성이 어떤 회화 ‘1’의 확장을 위한 것인지 혹은 해체를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동일한 크기의 회화가 마치 무언가를 조직하는 (혹은 분열하는) 최소 단위처럼 반복된다는 건 분명하다. 그리고 이 반복은 회화의 고정된 사각 프레임을, 그 안에 그려진 자연사박물관의 네모진 방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나아가 회화와 박물관의 긴 역사를, 특정 시기와 특정 문화를 구분하고 또 연결하는 양식들을 떠올리게 한다. 누군가는 화려한 왕실에 또 누군가는 감옥이나 무덤에 비유할 프레임과 방은, 전통적 양식을 재고하려는 시도 위에 유령처럼 떠돈다.
그렇게 《square_bi:tjlfhgadfdagggg》의 ‘스퀘어’는 끊임없이 재발견되는 매체의 전형으로, 또 속박된 상태이지만 자유를 느끼는 모순된 감옥처럼 다가온다. 같은 맥락에서 스퀘어를 회화의 고유한 조건이자 환영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외부세계에 대한 차단과 방어를 뜻할 수도 회화의 독창성과 유일성을 가리킬 수도 있다. 하지만 전시에서 스퀘어는 절대적 표상이 아닌 이동과 흔들림, 겹쳐짐과 흩어짐을 지시한다. 필연적으로 한 화면에서 다음 화면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전시에서 그것은 회화 자신의 기원을 확고히 하는 중심이 아니라 증식과 해체의 반복적 입체 구조로 도열한다. 원본, ‘1’에 대한 집착인지, 혹은 그 지위를 박탈하는 ‘0’으로 수렴하는 것인지, 혹은 그 둘 사이를 부단히 횡단하는 어떤 움직임인지는 해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전시에서 스퀘어와 그 반복은 분명 이동과 탈피, 동요를 거듭한다. 전시 공간의 수평선에 정렬된 회화는 각기 다른 시공의 층위를 뒤섞어 놓듯 다른 관점이 투사되어 서로 충동하고 지지하고 중첩된다. 불규칙적으로 도는 컨베이어 벨트처럼, 전시 속 회화는 결코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하나의 단어가 사전적 의미에서 벗어나 다음 단어, 다음 문장, 단락, 페이지로 넘어가며 그 뜻을 바꾸듯, 자기 폐쇄 상태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전시 속 스퀘어는 완성되는 일 없이 다음으로 옮겨가며 해제된다. 그것은 무엇을 형상화했으며 어떤 한 장소를 점유했다고 말할 수 없는, 차이와 지연, 어긋남과 흔들림으로 이루어진다.
각각의 작업은 이미지를 일종의 환각지대로 몰아간다. <1>, <2>, <3>, <4>의 작업들이 프레임의 오랜 관습을 취하듯, 전시의 모든 작업은 흰 벽에 보기 좋게 걸린 채 깊은 환영의 문법에 침투한다. 그러나 이 환영은 각 화면의 면밀한 세부묘사나 폭발적인 표현에 기인하지 않는다. 오히려 작가는 대상을 RGB 컬러 스펙트럼으로 해체하고 그것을 다시 중첩하는 그리기를 통해 화면을 움직이는 상자처럼 요동치게 만든다. 불확실한 중심을 두고 칠해진 빨강, 초록, 파랑의 삼원색은 그려진 대상뿐 아니라 그것을 인지하는 눈을 관습 밖의 영역으로 이끈다. 여기 그려진 박제들과 자연은 재현된 대상이 아닌 회화, 그 막의 불투명성이 초래한 허상과 관계 맺는다. 회화의 막에 안착한 이미지는 그 자체로 물질성과 즉물성을 드러내고 매체와 기호의 매개물로서 인지된다. 이번 전시에서 최수정은 이전 식물 시리즈에서처럼 일차적 그리기가 아닌 이차적인 축조와 조직화를 통해 회화의 자발성과 즉물성을 보다 명백하게 표출한다. 작가에게 특정 대상을 그리는 일은 회화 매체의 인정이나 부정을, 특정 양식과 방법으로의 복귀를 의미하지 않는다. 대상을 묶어 두었던 스퀘어가 무너지듯 작가는 흔들리는 실체로서 회화를 제시한다.
최수정 회화의 즉물성은 RGB의 레이어뿐 아니라 그에 더해진 자수를 통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작가는 앞서 설명한 해체하고 중첩하는 그리기에 캔버스에 자수를 두는 행위를 더한다. RGB로 해체된 컬러 레이어는 마치 수공예 작업처럼 화면에 조금씩 하지만 확고하게 자리하는 자수들과 한 화면을 구성하며 또 다른 실재의 관계를 형성한다. 회화 막의 앞뒤를 수없이 오가는 자수는 화면에 미세한 돌출을 남기며 시점의 미묘한 붕괴와 거리감을 만들어 낸다. 이 과정의 일부는 철저하게 계산되고 일부는 즉흥적으로 진행된다. 임시성과 나란히 세워진 계획된 공정은 대상의 존재성과 유일성에 복수성과 복제성을 더하며, 다시 한번 대상을 뿌옇게 흔들리는 이미지로 제시한다. 여기서 관객은 고정된 시점에 걸린 대상과 경치를 점유한 수용자를 넘어 능동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거리를 조정하고 눈과 몸을 움직이며 하나의 회화를, 또 그와 함께 분열하는 회화들을 보게 된다. 시점은 사방으로 흩어진다. 관찰자의 눈은 모든 방향에서 관찰자를 둘러싸고 있는 영역 전체를 포함한다. 마치 박제된 새의 유리 눈알이 관찰자 또는 침입자의 공간을 수렴하면서 반사하듯, 각각의 작업은 회화 막을 관찰점이나 소실점에 고정하지 않고 이동과 움직임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한계점 없는 공간으로 펼쳐 보인다.
최수정 개인전 《square_bi:tjlfhgadfdagggg》는 망막의 경험이 흐려지고 흔들리는 동시에 다른 경험으로 전환되는 장면을 보여준다. 누군가는 보기의 실패라 말할 이 경험은 사실 특정한 시각성을 설정하거나 그것의 성패를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의 교란과 얼룩, 잔상과 움직임을 드러낼 뿐이다. 물론 이들 회화는 모두 움직임이 없는 정지화면이다. 하지만 거기엔 맥락화된 역사와 방법이 담론과 해석들이 웅성거린다. 전시는 그것을 인용하고 질문하며 흩트리고 다시 유포한다. 여기서 회화는 더 이상 폭로되고 거부되어야 할 신화가 아닌 듯하다. 전시는 시각적이고 즉물적인 예시의 장면으로 회화(와 그 운동하는 역사)를 보여주는, 일종의 알레고리적 양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수정의 그림은 분명 회화 안팎의 허무와 죽음의 영역을 거치지만, 부재를 향하는 대신 이미지의 힘을 증가시킨다. 자신을 둘러싼 죽음과 공허를 응시하는 작업은 (물론 영원히 좌절될 수밖에 없는) 초월성을 열망하는지도 모른다. 여전히 회화는 실재들로 뒤엉켜 흔들리고, 충분히 시각적이며 자기 지시적이다. 그럼에도, 어쩌면 그것은 신기루이기에 더 매혹적일지도 모른다.
기획, 글 권혁규
Death does not speak for absence. In graveyards, people come and go with flowers, regrets and longings pile themselves up on top of the breathing nature, and a certain wish or desire for something tags along with death and life. Perhaps death is only able to be perceived through the wildly fluctuating presence of here and now. Death may be a state entangled with absence and presence, a number of memories and emotions, or a shaking that arouses vertigo and a carnival of their afterimages.
Choi Soo Jung’s solo exhibition square_bi:tjlfhgadfdagggg roams around this death. The exhibit shows scenes one might see in a natural history museum. The dead reenacting the alive, stuffed animals on a staged nature, and a theatrical situation of death (or life) are depicted. It focuses on things that are clearly virtual but in presence, things that are visible but already dead. The state of ‘living death’ overlaps with the medium of painting. As its long history reveals itself, painting has joined the manifestation of death. The image settled on a flat canvas in a square frame has created a virtual stage, a visual and emotional illusion, and visualizes objects and narratives, and senses and atmospheres that are not apparent in existence. Choi’s exhibition is a festival or carnival of sorts, bringing together the medium of painting and its objects that have been associated with death for so long. Of course, this carnival is more of a mirage: just like the unpronounceable title of the exhibition.
The exhibition consists of ten new paintings of the same size. The works titled 1, 2, 3, and 4 are displayed in space, self-expanding or dividing into 1, 1-2, 1-2-3, 1-2-3-4. It is unclear whether this composition is to expand the painting of ‘1’ or dismantle it, but it is clear that the paintings of the same sizes are repeated as the smallest units that organizes (or divides) something. This repetition recalls the fixed square frame of the painting and the square room of the natural history museum within which it was painted. Furthermore, it recalls the long history of painting and museums as forms that distinguish and connect certain periods and cultures. Frames and rooms, likened by some to opulent royal palaces and by others to prisons or tombs, hover like ghosts over attempts to rethink traditional forms.
As such, the ‘square’ of square_bi:tjlfhgadfdagggg is delivered like an epitome of a medium that is being constantly rediscovered, and a contradicting prison in which one feels free while being imprisoned. In the same context, the square can be viewed as a unique condition of painting, and an illusion of it. It may mean blocking and defense against the outside world, or it may refer to the originality and uniqueness of painting. However, in the exhibition, the square does not instruct an absolute representation. It instructs the movement, shaking, overlapping, and dispersing. In an exhibition where a viewer inevitably moves from one screen to the next, the square is not a center that solidifies the origin of painting, but a recurring three-dimensional structure of multiplication and dissolution. Whether it is an obsession with the original, the ‘1,’ or a convergence on the disenfranchised ‘0,’ or some kind of movement between the two, is open to interpretation, but the square and its repetition in the exhibition are clearly in a state of flux, dislocation, and agitation. Different perspectives project the paintings aligned on the horizon of the exhibition space, as if different layers of time and space were mixed, crashing, supporting, and overlapping each other. Like an irregular conveyor belt, paintings in the exhibition never exist in a fixed form. Just as one word deviates from the dictionary meaning and moves on to the next word, sentence, paragraph, and page, changing its meaning, the square in the exhibition, which cannot exist in a self-closed state, is lifted by moving on without completion. It consists of differences and delays, deviations and shakings, which cannot be said to have embodied anything, or occupied any one place.
Each painting of square_bi:tjlfhgadfdagggg drives the image into a kind of hallucination zone. Just as the works of 1, 2, 3, and 4 take on the old custom of frames, all the works of the exhibition penetrate the grammar of deep illusion, hanging nicely on the white wall. However, this illusion is not due to the detailed description or explosive representation of each screen. Rather, the artist deconstructs the object into an RGB color spectrum and reassembles the color layers through overlapping drawing, and makes the painting look like a moving box. The tricolor of red, green, and blue, painted with an uncertain center, lead not only the painted object, but the eye that perceives it, into a realm outside of convention. The stuffed animals and nature depicted here does not relate to reproduced objects, but to paintings, and the illusion caused by the opacity of its membrane. The image settled on the membrane of the painting itself reveals materiality and immediacy, and it is perceived as a mediation of painting and its sign. In this exhibition, Choi Soo Jung expresses the spontaneity and immediacy of painting more explicitly through secondary construction and organization unlike in her previous plant series. For the artist, painting a specific object does not mean to recognize or deny the painting medium or a return to a specific style and method. Just as the square that tied the object collapsed, the artist thinks of paintings as a shaking entity.
The existence of Choi’s painting is more clearly revealed not only through RGB layers but also through the embroidery added to them. The artist adds the act of placing embroidery on the canvas to the dismantling and overlapping painting described above. The color layer dismantled into RGB colors forms another real relationship, forming one screen with embroidery that sits little by little, but firmly on the screen, like a handcrafted work. The embroidery that goes back and forth numerous times in the painting screen leaves a minute protrusion on the screen, creating a subtle collapse and a sense of distance of point of view. Some parts of this process are thoroughly calculated, and others are improvised. The planned process, which is built alongside the temporariness, adds pluralism and replication to the existence and uniqueness of the object, and once again presents the object as a hazy image. Here, the audience reacts actively, and as someone beyond a mere reciprocator of the object and the scenery that is fixed in a certain perspective. They come to observe a painting, and the paintings that divide with it by adjust their distance with the painting and move their eyes and bodies. Perspectives scatter in all directions. The observer’s eyes include the entire area surrounding the observer in all directions. Just as a taxidermized bird’s glass eyeball reflects as it converges through the observer or intruder’s space, each work is displayed in a limitless space that requires moving without fixing the painting membrane to neither the observation point nor the vanishing point.
Choi Soo Jung’s solo exhibition square_bi:tjlfhgadfdagggg depicts scenes in which the retinal experience is blurred and shaken, while also being converted to another experience. Some would call this experience a failure of viewing, but in truth, the experience does not attempt to set a particular visuality or distinguish its success or failure in the first place. It only reveals its disturbance, stains, afterimage, and movement. Of course, all these paintings are still images that lack actual movement. However, contextualized history and methods, discourse and interpretations express themselves and quiver in it. The exhibition quotes, questions, scatters and re-spreads them. Here, painting is no longer a myth to be exposed or rejected. The exhibition can be said to be in an allegorical form displaying painting (and its moving history) as an exemplary scene for visuality and materiality. Choi’s paintings clearly pass the realm of emptiness and death inside and outside painting, but instead of going towards absence, they rather increase the power of the image. The painting of staring at the death and emptiness surrounding oneself may aspire to transcendence (which is bound to be thwarted forever, of course). Still, her painting is intertwined with reality, and is sufficiently visual and self-referential medium. Nevertheless, it is a mirage, which perhaps makes it even more fascinating.
Kwon Hyukgue
translated by Lee Ji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