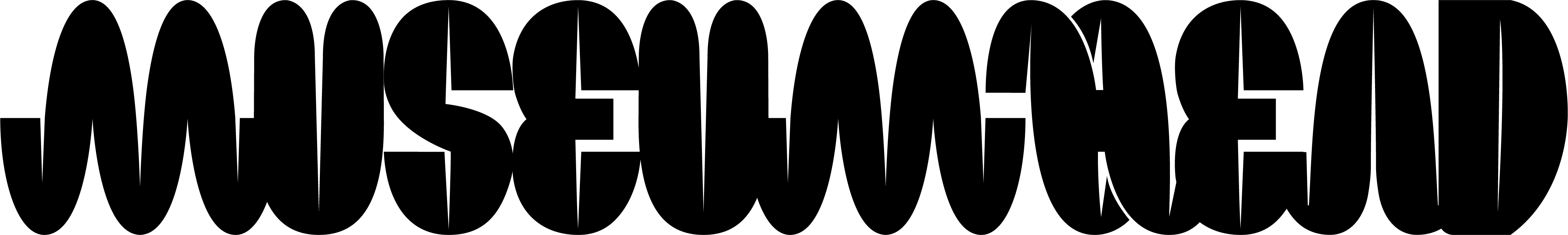《무덤들》
김주리, 안경수
24.11.21.—25.01.25.
12:00-19:00 (일, 월 휴관)
기획: 권혁규
그래픽 디자인: 유나킴씨
설치: 김병찬
주최, 주관: 뮤지엄헤드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𝑷𝒍𝒖𝒕𝒐
AN Gyungsu, KIM Juree
24.11.21.—25.01.25.
12:00-19:00 (closed on Sun, Mon)
Curated by KWON Hyukgue
Graphic Design: Yunakimc
Technical Support KIM Byungchan
Hosted and Organised by Museumhead
Supported by Arts Council Korea
“지금 있는 그대로의 세계는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달이 필요한 거야.
아니면 행복이, 아니면 불멸의 생명이, 어쩌면 미친 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세상 것이 아닌 어떤 것이 필요한 거야.”
알베르 카뮈, 「칼리굴라」 중에서[1]
벽으로 막아 만든 칸이 있다. 방이 되고, 집이 되고, 미술관이 되며, 때로는 무덤이라 불리는 그곳. 어제의 일들이 고이 수장되는 장소. 어떤 이는 모든 것이 멈춰 있다고, 무엇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자리.
《무덤들》은 서슴없이 죽음을 지시한다. 이 글이 놓일 칸, 전시장은 지나가버린 이미지와 물질(만)을 증언한다. 이곳 그리고 저기에, 죽음은 도처의 삶 속에 얽혀 있다. 재난과 전쟁, 도시 개발의 틈새, 일상 속에 실제이자 관념으로 자리한다. 죽음은 어쩌면 끊임없이 지속되는 삶을 통해, 오히려 살아있음 속에서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현재는, 도시는 죽음을 배제한다. 완전함과 정상성, 결과와 효율, 끊임없는 성장을 미덕으로 삼으면서, 허약하고 낡은 것, 죽음에 다가서는 것을 밀어내고 추방한다. 용산과 이태원 일대의 개발은 과거를, 심지어는 재난과 비극마저도 빠르게 허물어버린다. 죽음 위에 새로운 개발과 소비의 욕망이 쌓이고, 그곳엔 낯선 장면들이 세워진다. 누군가는 터전을 잃고, 자신이 쌓아온 공간과 역사에서 간단히 추방당한다.
김주리 · 안경수 2인전 《무덤들》은 지워지는 죽음을 마주하는 하나의 ‘칸’이 되려 한다. 전시는 죽음을 외면하는 도시의 모순을 어떤 ‘막’이나 ‘물질’로 사고한다. 여기서 ‘무덤’은 단순히 생물학적 의미의 죽음을 소환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죽음, 죽어있는 삶의 역설을 중재하며, 한때 삶이었던 죽음을 또 다른 가능성으로 되새기고 감각하는 공간으로 자리한다.
김주리와 안경수는 오랜 시간 작업을 통해 도시 속 소멸하는 죽음/삶과 마주해왔다. 김주리의 <휘경;揮景>(2008~) 시리즈는 점토로 빚은 도시 풍경과 주택이 전시장에서 물에 녹는 과정을 보여주었고, <모습某濕>(2020~) 시리즈는 소멸의 과정을 숨 쉬는 흙으로 물질화하며 생명과 사라짐의 초/자연적 교차점을 가설했다. 안경수의 <막 membrane>(2016)과 <교외 suburb>(2021) 같은 시리즈는 장막처럼 드리운 화면이나 얼룩진 표면을 통해 도시에 소외된 흔적과 그 경계를 담아내며 방치된 장소들의 침묵과 잔재를, 그 정서를 시각적으로 풀어냈다. 그 속에는 고요한 대상들, 단절된 존재의 냉랭한 소외감이 쓸쓸하게 때로는 경이롭게 목격되기도 했다. 박탈과 상실을 내재한 작업들은, 도시의 욕망에 눌려 퇴색되고 망각된 존재들을 어둠 속에 비추거나, 때로는 새로 태어난 (죽음의) 생명력으로 발현시켰다. 그것은 얼핏 절망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절망을 직시하려는 강렬한 의지의 서곡처럼 들려왔다.
《무덤들》에서 김주리와 안경수는 과거 작업의 시도를 다시 살피며 도시의 주변화되고 사라지는 장소를 재인식한다. 이전 작업에서 부각된 ‘사라짐’, ‘주변’의 정서는 이번 전시에서 확장된 시간과 장소, 역사 속에 위치하며, 그 기억과 망각의 작용을 되짚어 보게 한다.
흙의 작용을 일종의 은유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되는 장소의 죽음과 생명력을 드러냈던 김주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같은 재료를 가마에 굽거나 단단하게 다지고, 또 주형하는 등의 방식을 선보인다. 앞서 언급한 <휘경;揮景>, <모습某濕> 시리즈에서 살아있는 듯했던, 그러나 전시 이후 소멸됐던 흙은, 이번 작업에서 비 · 바람을 맞고 풍화를 거쳐 생성되는 자연 상태의 지형 혹은 형상처럼 굳어져 보다 영속적인 상태를 취하게 된다. <clay tablet>(2024)은 자연적 소멸의 장면을 체화하는 듯 물리적 압력에 의해 생성된 지층의 결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사라짐의 과정 자체보다 물질과 기억의 관계를 포착하는 것으로, 형태의 변형/유지를 거듭하는 한편 완벽한 소멸 이전의 어떤 존재 상태에 도달한다. 마찬가지로 전시장 내외 공간을 채우고 있는 <Column>(2024)은 아파트 평면도 모양을 본떠 삼차원 기둥으로 올린(혹은 눕힌) 것으로, 사라짐보다는 고대 유적지의 흔적처럼 그 터를 딛고 남은 물질에 주목하게 한다. 작가는 생명과 죽음, 기억과 망각의 경계를, 또 이전의 소멸과 흔적을 다시 물질화하듯 형체를 고정하고 모종의 영속성을 끌어낸다. 이 과정은 단순한 조형의 완성을 넘어 치열한 몸과 의식의 개입을 동반하고, 시간과 물질, 기억과 망각은 더욱 선명한 지속 안에 교차한다. 과거 작업에서 흙이 그 즉물성과 습윤함으로 조각에 유한한 생명력을 불어넣었다면, 이제 그 생명력은 다른 시간과 방법을 통해 지속성으로 변환되고, 세월을 품은 고대 조각상처럼 시간의 흔적을 드러낸다. 부서진 건물의 잔해들을 갈아 흙과 함께 결합한 작업은, 사라짐의 물질화와 흔적의 영속성 사이 긴장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전시장에 하나의 ‘저장소’로 존재한다. 사라짐을 내재한 물질, 사라지지 않는 사라짐의 장면은, 지금 이곳의 시각적 · 촉각적 인식을 넘어서는 다층적 시간성을 함축하고 또 매개한다.
《무덤들》에서 안경수는 어떤 장면/대상을 ‘다시 그린다’. 여기서 ‘다시 그리기’는 단순히 지우기나 덮어쓰기가 아니라, 잔존하는 기록을 다시 새기는 행위에 가깝다. 보광동 재개발 지역을 꾸준히 기록하며 회화로 옮겨온 작가는 전시장 한쪽 벽에 또 다른 공간, 보광동의 어느 “유치원과 화원”을 들여온다. 사라진 장소를 여러 겹의 그리기로 가설한 <유치원과 화원>(2024)은 회화의 ‘막/평면’을 통해 무덤을 자처하는 장면을 만든다. 분절된 동시에 전면화된 시점의 ‘막’은 일차적으로 물리적 ‘면’이나 ‘경계’를 가리킬 뿐 아니라, 도시의 생명과 죽음, 시간과 공간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지점을 환기한다. 각기 다른 회화의 방식과 물성을 결합하고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여러 층위의 ‘막’을 시각화해 온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일종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회화-막을 선보인다. 그 ‘막’은 특유의 색감과 스며드는 효과, 표면을 확인시켜주는 뿌리기와 흘리기의 방법을 통해 시간의 적층을 고유한 회화적 이미지로 가시화한다. 여기 ‘파노라마’는 특정한 몰입적 시각 경험을 제시하는 틀이 아니라, 가시성의 회화/평면이 실제 공간의 일부로 확장되며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이 존재적으로 얽히는 장소가 된다. 그곳과 이곳, 내부와 외부, 사라진 것과 그려진/만들어진 것이 중첩되고 펼쳐지며, 파노라마적 시각성은 장소와의 연속성 속에서 또 다른 감각을 일깨운다. 이곳의 회화, 그것이 드러낸 소멸은 멀리 떨어져 바라보는 시각적 유희의 대상으로 존재하기보다, 현재의 ‘칸’—존재론적 부피—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폐허표본>(2024)은 <유치원과 화원>의 장소/풍경과 관계하며, 이미지가 고립된 공간이 아닌 기억이 상호작용하는 장소임을 명확히 한다. 회화의 시각성을 구체적인 시공간, 장소로 펼쳐 놓는 작가는, 무덤을 자처하는 작업이 삶과 죽음, 안과 밖 등의 경계를 넘어 확장하는 장면을 목격하도록 한다.
《무덤들》에서 두 작가는 물질과 이미지의 고립을 넘어서며 열린 무덤으로의 입장을 제시한다. 이들은 각각 다른 매체와 방식을 통해 사라짐과 존재의 경계를 탐구한다. 그리고 그 경계 속에서 기억을 다시 순환시키는 이미지와 물질의 관계를 파고든다. 두 작가는 매체를 운용하고 규정하는 거창한 말 없이, 망각되는 세계를 마주한다. 그 세계는 쉽게 소진되지 않는다. 마치 무덤 앞에 서는 일, 할 수 없음으로 시작되는 과정처럼, 전시는 사라짐을 재인식하며 자기 내외부의 존재를, 그 소멸을 되짚어 본다. 그렇게 칸 안에 자리한 무덤은 사라짐을 기억 너머의 의미로 되살리고, 어떤 존재와의 연결을 되새긴다.
지구의 유일한 자연위성인 달은 종종 ‘죽은 행성’으로 간주된다. 생명체 활동도, 지질학적 변화도 목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달의 중력은 지구에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고, 지구 자전에 제동을 걸어 24시간의 하루, 오늘을 만든다. 인간은 달을 올려다보며 소원을 빈다. 저 죽음에는 결코 거머쥘 수 없는 움직임이 자리한다. 오늘의 궁핍을 초과하는 무엇이 그곳에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그곳에 죽음의 이야기들이, 숨결들이 세워진다.
기획/ 글 권혁규
[1] 알베르 카뮈(김화영 옮김), 「칼리굴라」, 『칼리굴라 · 오해』(책세상, 2013), 29-30.
The world as it is now is unbearable. That’s why I need the moon.
Or happiness, or immortality, or maybe I’m crazy,
but I need something that’s not of this world.
Albert Camus, Caligula[1]
Here is a walled cube. A room, a home, a museum, and sometimes a tomb. A place where yesterday’s remnants are tucked away, or some feel a stillness, a sense that nothing more can be done.
The exhibition confronts death directly, unflinchingly. Both this text and the exhibition space serve as witnesses to images and remnants of what has already passed. Here, death intertwines with life at every turn, manifesting in disasters, wars, urban voids, and the mundane routines of daily existence. It exists as both an undeniable reality and an abstract idea. Paradoxically, death reveals itself most vividly through the unyielding persistence of life—it is woven into the act of living.
Yet, the city conspires to exclude death. It idolizes ideals of perfection, normalcy, efficiency, and endless growth, while pushing fragility, aging, and mortality to the margins. In places like Yongsan and Itaewon, rapid urban redevelopment erases the past, sweeping away disasters, tragedies, and histories. New desires and constructions rise in their place, creating surreal landscapes of forgetting. In this relentless transformation, some are displaced, exiled from the spaces and narratives they once inhabited.
The exhibition Pluto by KIM Juree and AN Gyungsu tries to be a ‘compartment’ to face the erasure of death. The exhibition considers the contradiction of a city that turns a blind eye to death as a kind of ‘membrane’ or ‘substance’. The ‘tomb’ here does not simply summon death in the biological sense. Rather, it mediates the paradox of living death and dead life, and becomes a space where death, which was once life, is recalled and sensed as another possibility.
KIM Juree and AN Gyungsu have been confronting the vanishing death/life in the city through their works for a long time. KIM’s series Hwigyeong; 揮景 (2008-) showed cityscapes and houses made of clay dissolving in water in the exhibition space, while her series Wet Matter 某濕 (2020-) materialized the process of disappearance into breathing soil, hypothesizing the supernatural intersection of life and disappearance. AN’s series such as Membrane (2016) and Suburb (2021) visually unravel the silence, remnants, and emotions of neglected places, capturing the traces of urban marginalization and its boundaries through curtained screens and stained surfaces. The silent objects, the cold alienation of disconnected beings, are witnessed in a lonely and sometimes wondrous way. The works, imbued with deprivation and loss, illuminated faded and forgotten beings pressed by urban desires, sometimes in darkness, sometimes with renewed (death) vitality. It was a prelude to an intense will to face that despair, even though it wore the face of despair.
In Pluto, KIM and AN revisit the attempts of their past works and rethink the peripheralization and disappearance of places in the city. The sentiments of ‘disappearance’ and ‘periphery’ highlighted in their previous works are located in an expanded sense of time, place, and history in this exhibition, and the workings of memory and forgetting are revisited.
KIM Juree employs soil as a metaphor to explore the intertwined forces of life and death in spaces that decompose over time. For this exhibition, she transforms soil through a meticulous process—baking it in a kiln, grinding it into a solid mass, and molding it into enduring forms. In earlier works like Hwigyeong; 揮景 and Wet Matter 某濕, soil appeared alive but ephemeral, vanishing after the exhibition. In contrast, her new series solidifies this transient material into shapes resembling natural terrains formed by rain and weathering. The series Clay Tablet (2024) highlights compressed strata grains formed under physical pressure, evoking scenes of natural disappearance while emphasizing the interplay between matter and memory rather than the disappearance itself. Similarly, Column (2024), a three-dimensional structure shaped like an apartment floor plan, occupies the exhibition’s interior and exterior spaces. Echoing the remnants of ancient ruins, this work emphasizes what remains over what has been lost. Through these creations, KIM navigates the boundaries between life and death, memory and oblivion, permanence and transience. By fixing and rematerializing traces of prior disappearances, she underscores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ty and memory. This approach transcends traditional sculpture, engaging deeply with body and consciousness, where time, matter, and memory intersect. While her earlier works captured clay’s wetness and immediacy, suggesting a fleeting vitality, these new pieces transform that vitality into enduring persistence, akin to ancient statues etched with time. Combining rubble from broken buildings with ground soil, the works encapsulate the tension between disappearance and permanence, existing as “repositories” within the exhibition space. These pieces mediate layered temporalities that extend beyond immediate perception, presenting the materialization of disappearance as a powerful commentary on the enduring traces of what has been.
In this exhibition, AN Gyungsu engages in an act of “repainting” certain scenes and objects. This process goes beyond erasure or overwriting—it is a reinterpretation of residual records tied to a place. Through consistent documentation of the redevelopment area in Bogwang-dong, Seoul, the artist translates these observations into layered and multifaceted paintings. A centerpiece of this exhibition, Pre-kinder and Plant Pot (2024), reimagines a disappeared space, creating a tomb-like atmosphere on the painting’s “membrane/plane.” This “membrane” serves as both a physical surface and a metaphorical boundary where life and death, time and space, intertwine within the urban fabric. By employing diverse materials and techniques—such as seeping effects and sprinkling methods, AN visualizes overlapping membranes, capturing the accumulation of time through painterly images. These works stretch like panoramas, not to offer immersive visual experiences but to extend the field of visibility into the physical world. In doing so, past and present, absence and presence, disappearance and construction converge, forming an existential connection to the depicted place. Complementing Pre-kinder and Plant Pot, Ruin Specimen (2024) highlights the dynamic interplay between memory, time, and materiality, revealing these paintings as interconnected narratives rather than isolated images. Together, these pieces transform painting into ontological spaces—more than static visual artifacts, they become “cubes” or rooms of continuity and memory. By intertwining painting with tangible elements of time and space, AN’s work redefines the concept of a tomb—not as a site of finality, but as a nexus for interaction, continuity, and evolving presence.
In Pluto, the two artists transcend the isolation of material and image, metaphorically “opening tombs.” Through diverse media and methods, they probe the boundaries between disappearance and presence, delving into the interplay between image and matter that recirculates memories within those boundaries. Confronting the realm of oblivion without relying on grandiose definitions or constraints of their mediums, they navigate a world that resists exhaustion. Like the act of standing before a tomb—a gesture often fraught with hesitation—the exhibition reflects on the disappearance of the self and its internal and external existence. In doing so, the compartmentalized tomb becomes a space that revitalizes the concept of disappearance beyond mere memory, evoking a connection to something more profound.
The Moon, Earth’s only natural satellite, is often perceived as a “dead planet.” It exhibits no signs of life or geological activity. Yet its gravitational force shapes the tides on Earth and slows Earth’s rotation, giving us the 24-hour day. Humans gaze at the Moon, projecting wishes and dreams upon its surface. There is a movement there that death cannot claim, a force that transcends daily necessity. In that space, the breath and stories of death find form, suggesting that even in absence, there is creation and life.
KWON Hyukgue, Museumhead Chief-Curator
[1] Albert Camus, Caligula(1938-44) originally in Fren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