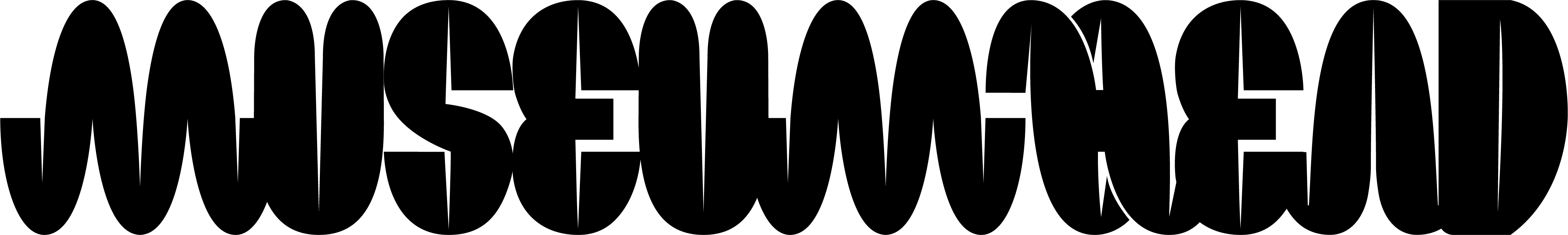《흑백논리》
권도연 금혜원 김천수 김태동 김효연 노순택 이현무 홍지영 홍진훤 황예지
2024.08.30.-11.02.
12:00-19:00 (일, 월 휴관)
기획: 권혁규
협력 및 진행: 허호정, 도혜민
그래픽디자인: 프론트도어
설치: 김병찬
주최, 주관: 뮤지엄헤드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4년 시각예술창작산실
B/W SIGNALS
GWON Doyeon, KEUM Hyewon, KIM Chunsoo, KIM Taedong, KIM Hyoyeon, NOH Suntag, LEE Hyunmoo, HONG Jiyoung, HONG Jin-hwon, HWANG Yezoi
30.AUG.-02.NOV.2024.
12:00-19:00 (closed on Sun, Mon)
Curated by KWON Hyukgue
Curatorial team HUR Hojeong, DO Hyemin
Graphic design Studio front-door
Technical Support KIM Byungchan
Hosted and Organised by Museumhead
Supported by Arts Council Korea, 2024 ARKO Selection Visual Art
흑백논리
갈라치기의 시대이다. 세대, 성별, 지역, 계급, 빈부, 좌우, 정상과 비정상, 낡음과 첨단, 팔리는 것과 팔리지 않는 것, 심지어는 애도의 태도마저 올바름과 저열함으로 나눈다. 분별없는 재단과 판단을 앞세우고 옳지 않다, 위험하다 말하며 제재한다. 손쉽게 분리와 혐오가 조장되고, 불필요한 변명과 이미 알고 있는 오답노트로 세월을 낭비한다. 당연히, 현실은 간단히 결론 나지 않는다. 무분별한 분리와 극단주의가 고약한 현실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 뿐이다.
현실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오늘 이미지는 이 현재에 어떻게 가담하는가.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도처의 이미지를 인식론적으로 파악할 수 없게 됐는지도 모른다. 통일된 관계나 의미체계로 존재하지 않는 당대 시각장에서 확실한 건 그것의 불확실성뿐일지도, 파편화된 오늘을 총체적으로 매핑한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른다.
‘선명해지는 불확실성’은 이미지를 더욱더 나태하고 간사하게 극단화시키곤 한다. 올바름을 말하는 어떤 이미지는 모두를 위한 정의를 납작하게 제시하며, 형식적으로 또 윤리적으로는 조작된다. 어차피 옳게 될 수 없음을 인정한 또 다른 이미지는 근거 없는 취향과 감각을 추종하며 스타일과 장식의 문법에 신속하게 합승한다. 더 심각한 경우, 이미지에 대한 불신 자체를 일종의 동력으로 삼기도 한다. 전쟁과 재난 같은 고통을 특권화하는 파티를 열어 조회수를 뽑고, 관계없는 세계의 타인을 브리지 삼아 본인의 삶을 영위한다. 여기서 팩트 체크와 다큐멘터리적 시선은 진지함보다는 강렬함을 쫓는 가장 상업화된 증언이자 이벤트로, 온갖 협박과 착취, 음모론이 응집하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사진’은 이와 같은 동시대 이미지의 속성을 여실히 드러내곤 한다. 대중매체와 가까이 자리하며 감성과 취향의 소비 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동시에, 가장 퇴보하는 듯한 매체이기도 하다. 어느 때보다 탐욕스러운 시선을 숨김없이 표출하기도,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채택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그 존재 방식과 형식이 (거의 습관적으로) 재고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사진을 보는 또 찍는 행위 자체가 손 안의 스마트폰, 도처의 인생네컷과 함께 가장 일상적인 이벤트이자 체험이 된 풍경은 말 그대로 모순적으로 다가온다. 그것은 오늘 사진/이미지의 불확실성을 날려버리는 가장 밝은 빛으로 다가와, “경험의 시세는 하락”했음을 증명한다.[1] 가장 밝고 선명한 곳의 축소된 이미지 안에서, 또 그것의 무한 복제와 증식 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불확실의 확실성 속 존재를 포착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것이 오류로 판명 날지라도, 투명하기보다 불투명한 순간들을 통해 무언가를 사고하려 시도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흑백논리》는 사진전이다. 전시장에는 권도연, 금혜원, 김천수, 김태동, 김효연, 노순택, 이현무, 홍지영, 홍진훤, 황예지 총 10명 작가의 흑백 사진이 놓인다. 전시가 말하는 사진의 ‘흑과 백’은 이분화되고 극단화된 이미지의 기능을 비판적으로 재고하며, 둘 사이를 부단히 왕래하는, 또 횡단하는 움직임을 가리킨다. 여기 작가들이 마주하는 대상과 관심사들, 목격과 기록의 양상들, 역사적 조건과 개념들, 테크놀로지의 증거와 전략들, 감각의 표출은 무조건적으로 합의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이들은 합의와 편향을 넘어선 자국으로 나타나고, 쉽게 부정되거나 축소되었던, 또는 간단히 구분되어 버렸던 모종의 존재들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전시는, “사이에 존재했음 interfuit”[2]으로 설명되는 사진의 (고유한) 성질을 탐색하며, 그것이 오늘 하락한 이미지의 보기-경험에 어떤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 질문한다.
같은 맥락에서 《흑백논리》는 이미지의 객관성과 주관성을 구분하고, 각각을 따로 강조해 온 사진의 일반적 개념을 비판적으로 사고한다. 사진은 객관적인가, 주관적인가[3]라는 질문과 함께 흔히 말하는 사진의 객관성이 단편적인 리얼리티와 진실의 개념을 넘어 보다 복잡한 층위에서 사고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다큐멘터리와 예술작품, 진실과 허구를 분리하는 이분법을 문제 삼는다. 분명한 사실, 또는 대상과 관계된 사진 이미지라 하더라도 그것은 늘 잠재적이며 복잡한 양상을 띨 수 있음을 강조하고 구분과 제한의 문법을 넘어서는 의미부여와 상상을 제안해본다. 그 자체로 총체가 될 수 없는, 사실의 일부분일 수밖에 없는 사진을 무기력하게 바라보기보다, 불완전한 사진/이미지가 왕래하는 사이의 간극과 차이를 역동적인 작용으로 간주해본다. 그렇게 오늘 사진의 불확실성(불투명성)을 특수한 시공간의 물질로 제시하고, 그로부터 이중적 실재성과 또 다른 객관성을 모색해본다.
이는 실제를 보기 위해 이미지 자체가 ‘질문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전시는 흔히 말하는 사진적 보기를, 다큐멘터리적 시선을 다시 사고한다. 특히, 현재를 중성화하고, 이미지로의 개입을 차단하는 형식들을 경계하며 개별성과 주관적 재/구성을 강조해본다. 사진의 기록성과 자료성(만)을 전면화하는 메마른 형식들을 의심하고 그것과는 다른 방향의 이미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사진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그것이 현실 또는 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이 아니라, ‘특정한 지점에서, 이미지를 규정짓는 담론’[4]을 구축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처럼 사진이 갖는 잠재성을 소거하지 않고 재현하며 여러 시선과 해석을 유도해 본다.
《흑백논리》가 지시하는 ‘가로지름’은 매체적 사고를 동반한다. 1970년대 후반까지도 현실의 재현은 흑백 톤으로 사고됐다. 흑백사진이 현실을—사진의 본령—을 드러내는 형식으로 여겨졌던 데 반해, 컬러사진은 일종의 가짜 광고처럼 여겨졌다. 반대로 오늘 흑백사진은 과거의 컬러사진처럼 의심스러운 형식이 되었다. 대부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되고 수정과 보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흑백사진은 이제 익숙하고 자연스럽다기보다 애써 만들어진, 가공된 것에 가깝게 느껴지기도 한다. 암실에서 필름 현상과 인화를 통해 만들어진 흑백사진이라도 디지털 환경 일반을 고려하면 부자연스럽게 다가오긴 매한가지다. 현실에 가장 가깝다고 여겨졌던 (색이 없고 정보가 부족한) 형식이 오늘 가장 가짜임을 의심받는 대상이 된 것이다. 전시의 ‘흑백사진’은 과거 혹은 현재의 특정 형식을 추억하거나 고집하기 위함이 아니라, 매체의 시차와 교차를 동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등장한다. 트로이의 목마 또는 도플갱어처럼 전통 사진과 같은 모습으로 위장한 오늘의 흑백/사진들은 얼핏 시대착오적으로 보이지만, 매체 특수성을 담지하고 있는 그 자체 미분화된 현상들이다. 이처럼 전시는 매체의 가상성과 현재성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는, 죽은 형식이 아닌 자기 확인이자 확장으로서의 특정 형식, 흑백사진을 탐색한다. 종말이 아닌 연속성 안에서 (어쩌면 종말의 연속성 안에서) 매체의 과거와 현재의 형식을, 또 차별되는 특성을 확인해본다.
《흑백논리》는 분리를 넘어서는 가로지름으로 극단화된 흑백논리의 극복을 시도한다. 이미지의 스펙터클에 무조건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판단과 동조를 촉구하는 선명한 출력을 외려 의심하는, 이미지의 불투명한 가능성을 탐구한다. 사진에 던져지는 필연적인 질문들—진짜인가, 어디서 어떻게 촬영했는가—대신, 근본적인 잠재성을 인지해 본다. 의심을 삭제하는 대신, 현실과 시간과 역사에 정박한 불투명성을 오늘 존재를 사고하는 계기로 삼아 본다. 그렇게 위장된 것, 일치하지 않는 것, 질문받는 것으로서 사진을 인식하고, 불확실성의 분명한 드러남으로 흑백사진들을 바라본다. 이는 진실의 재현으로서 사진을 맹신하지도, 그것의 가능성을 곧바로 부정하지도 않으며, 그 사이 어딘가에서 작동하는 일종의 ‘편입’[5] 행위로 사진/이미지를 사고하는 것이다. 전시는 믿음과 의문 사이에서 동작하는 사진을 오늘 이미지의 시급함 속에서 읽는다. 비록 그것이 질문 가득한 대상일지라도, 제대로 측정되거나 논의될 수 없는 오늘을 현실화하는 이미지로 전시의 흑백사진들을 제시해본다.
권도연의 <야간행>(2022)은 추적과 마주침, 혹은 대치로 나타난다. 여기서 마주침은 북한산의 들개, 소백산의 여우, 순천 폐가의 꽃사슴무리처럼 평범하지 않은 뒤섞임과 교차의 장면을 비춘다. 꽃사슴무리는 왜 저기, 아니 여기에 있을까. 뭘 하고 있는 것일까. 어딘가에 완전히 속하지 않은 존재의 상상은 흥미롭지만, 그것을 실제로 확인하는 건 기이한 일이다. 그래서 권도연 사진 속 대상과 장소들은 어딘지 환상적으로, 또 병리적으로 다가온다. 무분별한 도시 개발, 이종 간의 교류, 죽은 서식지, 폐허가 된 이상과 실현되지 않은 투쟁 등 앞뒤가 맞지 않은 상황들이 멀리서 아득히 감지된다. 작업을 지탱하는 마주침의 장면들은 적대를 넘어 대치 속 혼종이라는 이중의 아이러니를 드러낸다. 이미지의 포착과 수집은 또 다른 지각과 각성으로 이동, 분화된다.
금혜원의 <가족사진>(2018)은 오래된 가족 앨범에서 시작된다. 작가는 한국전쟁 전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외할머니의 앨범, 60-7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어머니 앨범 속 사진을 재촬영한 뒤 수정, 재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포토샵으로 사진 속 인물을 지우며 증명과 기념, 사건이 사라진 배경과 장소, 사물과 공간 사진만을 남겨 놓는다. 작업에서 ‘사진 촬영’은 시간과 장면을 넘어 프레임 바깥을, 흩어진 초점을, 기록과 상상의 경계를 향하는 것이다. 작가는 아무도 없는 과거의 공간/사진을 통해 어떤 인물을 회고하기도, 스스로를 투영해보기도, 전혀 다른 서사를 상상해보기도 한다. 여기 한 장의 사진은 누군가의 기록이나 기억이라기보다 잠시 멈춰선, 혹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현재이자, 어떤 상상의 배경이 된다.
김천수의 <Ai-mod q 135>(2024), <Ai-s 105>(2024)는 상충하는 사진 매체의 비가시적 역사를 근거로 삼는다. 작가는 한때 혁신적 기술로 주목받던, 지금은 그 이름조차 희미해진 AI(Automatic Indexing) 렌즈로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AI(Artificial Intelligence) 박람회장의 모습을 촬영한다. 사진에 남겨진 장면들은 최첨단 기술과 하등 관계없는 행사장 한구석의 포장지, 테이프 등의 ‘얇은 물질’들이다. 작업은 사실의 기록이라는 강령과 가장 진일보한 기술 기반 매체(여야만 한다)라는 사진의 자가당착적 상황을 가로지르는 듯하다. 전시장 벽에 행사장의 포장지처럼 인쇄된 작업은 확고한 이미지보다는 흐릿한 잔상과 착시만을 시각화할 뿐이다. 전시와 함께 사라질 작업은 오늘 사진/기술의 역설을 허무한 (종말/혹은 탄생의) 반복으로, 어느 때보다도 ‘얇은 이미지’로 나타낸다.
김태동 사진에는 그날의 순간이 담겨있다. 2008년 숭례문 화재 당시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작가는 무언가에 홀리듯 사진을 찍는다. 촬영(만) 했을 뿐 공개한 적 없는 그날의 사진을 작가는 오늘에서야 내보인다. 순간, 충격, 지배가 만들어낸 이미지는 더 이상 특정 사건, 대상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오늘과 다른, 흔적도 찾기 힘든 그날의 장면은 일종의 시차 안에서 선명해질 뿐이다. 끊임없이 서로를 침범하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흔들리는, 불붙은 연기 속의 윤곽 없는 세계로 인지될 뿐이다. 작가는 이를 강조하듯 여러 장의 연속사진들을 함께 전시한다. 특정 사건, 순간에 묶여있지만, 간단하게 의미를 결산할 수도, 분할할 수도 없는 작업은 순간을 남기고 싶다는 사진의 욕망을 보다 확장된 시간 개념 안에서 사고하도록 한다.
김효연의 〈마이 웨스턴 아메리카>(2015)는 풍경사진의 낯설음을, 그것의 실현 여부를 탐색하는 듯하다. 작가는 익숙하지 않은 장소를 촬영하기 위해 미국 서부로 향했지만, 할리우드 영화나 대중매체에서 이미 본 듯한 풍경만을 마주하게 된다. 익숙함에서 벗어나려 했던 여행을 통해 이미지-사진이 실제-사진이 되었을 때 야기되는 모종의 반동 혹은 어색함을 경험하게 된다. 평범한 ‘흑백 풍경사진’처럼 보이는 작업에는 이 같은 낯익음의 기이한 공연이 목격된다. 사진은 얼핏 네거티브 필터 효과를 준 것처럼, 하얗게 발색된 것처럼, 또 실제가 아닌 가상공간을 촬영, 출력한 것처럼 보인다. 전시장 앞마당에 대형 옥외 광고물 같이 설치된 작업은 가짜 익숙함과 낯섦을 증폭시키는 스펙터클이자, 착시를 일으키는 배경, 풍경이 되길 선택한다.
노순택의 <중간접착제>(2009) 연작은 대학로 연단에 올라 연설하는 야당 당수들—정세균 민주당 대표, 강기갑 민노당 대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뒷모습 실루엣을 담은 작업이다. 강하게 주장하고 조준하던, 선명했던 인물들은 오늘 전시장에 흑백의 뒷모습으로 나타난다. 악담에 가까운 반론을 내세우고, 근거 없는 분리와 혐오가 조장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이제는 흐릿해진 존재들의 실루엣은 첨예한 논쟁과 극단적 사고 이후를, 혹은 그것의 무용과 소용을 사고하게 한다. 뒷모습, 실루엣, 흑백, 연쇄, 중첩으로 시각화된 과거 야당 당수의 ‘연설하는 장면’은 불멸의 영웅이라기보다, 연결되고 분리되는, 고착되지 않고 변이하는 관계의 ‘중간접착제’로서 위 ‘사람’들을 재/호명한다.
이현무의 <Still Life>(2012~) 시리즈는 별 의미 없는, 빛바랜 정물 사진처럼 보인다. 하지만 작가는 별거 없음을 ‘리셋’ 가능한 지표로 설정하는 듯하다. 작업은 사물의 배경이 되는 (빈)공간, 공중에 매달린 사물, 사물의 그림자를 각각 따로 촬영한 후 하나로 겹쳐놓으며 완성된다. 3장의 이미지를 포개 만든, 평범해 보이는 정물 사진은 사물과 그림자의 미세한 분리 등의 부조화를 드러내며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다시 보게 한다. 그렇게 실제를 이미지로 남기는 사진의 존재론적 질문과 반성을 경유하며 이미지의 인식, 사유, 경험의 객관성을 해체한다. 해체된 파편들을 곳곳에 흩뜨려 놓듯 전시장 곳곳에 작고 얇게, 다소 위태롭게 위치하는 사진은 스스로의 추상성과 물질성의 간극을 재차 확인시킨다.
홍지영의 <Dark Room>(2024) 시리즈는 하나하나의 날들, 순간들을 지난다. 여기 레즈비언 커플과 친구, 동료들은, 그들과 함께한 장소와 사건들은 작가의 날들, 순간들로부터 제거 불가능해 보인다. 사진이 더 이상 삶의 본질에 접근할 수 없다고, 또 타인에게 가 닿을 수 없다고 대충 믿어질 때 작가는 자신과 불가분의 대상/순간들을 이미지로 남기며 자기 날들을, 모종의 연결을 거듭 확인한다. 작가가 말하는 ‘다이어리’로서의 사진은 어두운 암실에서 이미지를 모아 올리고 하얀 종이에 글을 쓰듯, ‘오늘 실행되는 기록’을 관통하며 개인적, 역사적 경험과 규정 사이에 혹은 너머에 자리하는 장면들을 담아낸다.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때로는 제거되고 의심받는 오늘의 장면들, 존재들을 유별난 놀라움에 가두는 대신 늘 마주하는 고유한 오늘로 전환해본다.
홍진훤의 <멜팅 아이스크림 – index>(2024) 시리즈는 80년대 민주화운동 당시의 촬영 필름이자 수해를 입은 필름을 복원한 사진, 한국전쟁 당시 주둔 미군이 여가시간에 취미활동으로 했던 사냥의 모습을 담은 사진, 1986년 챌린저 우주왕복선 폭발사고 장면으로 구성된다. 작가가 직접 찍지 않은 이 사진들은 흔히 말하는 다큐멘터리 사진의 존재론적 당위성을 현장의 목격과 재현에(만) 존속시키는 인식의 변용을 드러낸다. 현장을 동기화한다는 사진의 환상, 그로부터 발생하는 기이한 긴장감은 작가의 작업에서 일반적인 재현과 표상을 넘어 작동하는, 결코 고착될 수 없는 (녹아내리는) 이미지의 복원과 변이, 양도 행위로 대체된다. 영웅적 사진/이미지를 재고하고, 그것의 또 다른 국면을 모색하며 어떤 격리나 마비에서 풀려난 자기 반영적 움직임으로 사진을 제시한다.
황예지의 작업은 총 6장의 인물사진으로 구성된다. 인물사진이 드러내는 ‘너/당신은 이렇게 생겼다’는 대상의 단순 묘사라기보다 여러 기호가 뒤섞인 하나의 사건, 혹은 폭로가 되곤 한다. 여기 황예지가 촬영한 사진의 폭로는 엄격하다기보다 유연하다. 사진 속 ‘젊은 남성들’은 작가의 과거 ‘여성 초상’ 사진 속 인물들과 완벽히 구분되지 않는 젠더, 성적지향, 세대, 집단에 위치하는 듯, 미묘한 경계에 자리하는 모습이다. 이 사진들이 흔히 생각하는 (남자) 초상사진 속 인물의 성격, 노선, 신화를 간단히 초과하는, 미세한 특수성을 헤아리고 다시 상징화하는 시도로 다가오는 이유이다. 사진 찍히는 일이 더 이상 특권이 아닌, 심지어는 부질없는 일처럼 느껴지는 오늘, 작가는 초상 사진을 보다 내밀한 너와, 나(들)/우리를 발견하는 자기 투사와 쾌, 혹은 헤매임의 상태로 바라보게 한다.
기획/ 글 권혁규
[1] 조르주 디디-위베르만은 서치라이트, 광고판 같은 빛이 아니라 미미하게 빛나는 이미지를 말하며, 가치절하 된 경험을 구제할 이미지의 힘을 논한다. 조르주 디디-위베르만(김홍기 옮김), 『반딧불의 잔존』(길, 2016), p.123.
[2] 롤랑 바르트는, 사진에서 보이는 대상이 거기 있었지만(ça-a-été) 지금은(이미지에는) 없다는 이중적인 상태를 지적하며, 사진의 존재적 상태를 라틴어로 다시 옮겨 “사이에 존재했다inter-fuit”고 말한다. 롤랑 바르트(김웅권 옮김), 『밝은 방: 사진에 관한 노트』(동문선, 2006), p.99.
[3] 앙드레 바쟁이 「사진적 이미지의 존재론」(André Bazin, “Ontologie de L’image Photographique,”1945-48)에서 “리얼리즘”, “재현”의 목적에 있어 “완전[한] 충족”을 달성하는 매체로 사진을 조명하는 반면, 롤랑 바르트는 “나를[바르트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내가 확신했던 그런 사진들”만을 탐구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4] 이영준, 「8. 존 탁, 역사의 연필-사진, 증거, 역사의 문제」, 『사진이론의 상상력』(눈빛, 2006), p.90, 91. 같은 맥락에서 사진이론가 존 탁(John Tagg)은 『The Disciplinary Frame: Photographic Truths and the Capture of Meaning』(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9)에서 “사진적 진실”이란 일종의 규범적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5] 히토 슈타이얼은 다큐멘터리 이미지의 불확실성을 편입(Einbettung)의 개념과 함께 설명하며 우리 모두가 현실 속에 편입되어 있음을, 그 불확실성의 세계는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줌을 역설한다. 히토 슈타이얼(안규철 옮김), 『진실의 색: 미술 분야의 다큐멘터리즘』(워크룸 프레스, 2019), pp.13-15.
We live in an era of division—across generations, gender, region, class, wealth, political orientation, normalcy versus abnormality, the old versus the cutting-edge, marketable or not, and even the way we mourn, split into what is deemed proper or not. Rash judgments are quickly made, labeling things as wrong or dangerous, often followed by sanctions. Separation and hatred are easily ignited, and unnecessary excuses abound, wasting time on answers we already know to be flawed. Reality, of course, doesn’t lend itself to simple conclusions. Reckless division and extremism only make an already harsh reality even more unfortunate.
How can we perceive this reality? How does today’s imagery engage with this present moment? Perhaps we are no longer able to epistemologically grasp ourselves or the images that surround us. In a contemporary visual field that resists functioning as a unified system of relationships or meanings, the only certainty may be its inherent uncertainty. From the beginning, it may have been impossible to map our fragmented present in any comprehensive way.
The certainty of “uncertainty” often pushes images to become more indolent and deceptively extreme. Images that claim righteousness flatten the concept of justice, manipulating it both formally and ethically. Aware of their inability to truly be “right,” these images cater to baseless tastes and fleeting sensations, quickly aligning with trends of style and decoration. In more severe cases, distrust in images becomes a driving force, where spectacles that exploit suffering—such as wars or disasters—are used to boost views, leveraging the lives of others to sustain their own relevance. In this context, fact-checking and documentary perspectives morph into the most commercialized forms of testimony and spectacle, favoring intensity over sincerity, and becoming breeding grounds for exploitation, threats, and conspiracy theories.
Photography often epitomizes the contemporary image. It is both the most sought-after and regressive medium for consuming emotion and taste, closely aligned with mass media. More voracious than ever, photography continues to rethink its existence and form, particularly as we move beyond digital transformation and embrace the rapid adoption of AI. At this point, it seems paradoxical that both taking and viewing photographs have become such ordinary, everyday acts, with smartphones constantly in hand—camera flashes as the brightest light dissolving the uncertainty of modern images. These images, captured and reduced in their clearest moments, highlight the time of “decline of experience.”[1] Amid their infinite replication and proliferation, perhaps all we can do is seize existence within the certainty of uncertainty. Even if this is later revealed as flawed, it may still be an effort to engage with opaque moments, rather than seeking transparency.
B/W SIGNALS shows black-and-white photographs by 10 artists: GWON Doyeon, KEUM Hyewon, KIM Chunsoo, KIM Taedong, KIM Hyoyeon, NOH Suntag, LEE Hyunmoo, HONG Jiyoung, HONG Jin-hwon, and HWANG Yezoi. The exhibition critically reexamines the function of dichotomized and polarized images, highlighting the constant movement between these extremes. The subjects and concerns, methods of witnessing and recording, historical contexts, technological strategies, and sensory expressions that these artists engage with are neither unconditionally accepted nor one-sided. Instead, they present marks beyond consensus and bias, urging us to reconsider the multiplicity of beings often denied, diminished, or compartmentalized. The exhibition delves into the inherent nature of photography, as being-in-between (“interfuit”[2]), asking what effect this has on how we view and experience images in a time when their authenticity has seemingly “declined.”
In a similar vein, B/W SIGNALS explores the interplay between the objectivity and subjectivity of images, critiquing the common conception of photography that tends to emphasize each aspect separately. Is photography truly objective or subjective?[3] Confronting this age-old question, the exhibition challenges the traditional dichotomy that separates documentary from art, and truth from fiction. It argues that photographic objectivity can be understood in more nuanced ways, beyond simplistic notions of reality and truth. The exhibition underscores that photographic images, even those depicting clear facts or objects, are inherently complex and potential-laden. It encourages meaning-making and imagination that transcend rigid divisions and constraints. Rather than passively viewing a photograph as merely a fragment of fact, the exhibition invites us to engage with the gaps and differences between incomplete images as dynamic elements. Today, it presents the uncertainty (opacity) of photography as a distinctive material within space and time, and explores its dual existence and alternative objectivity.
The exhibition emphasizes that the image itself must become the ‘object of questioning’ to reveal the real. It reconsiders the so-called photographic and documentary gaze, focusing on individuality and subjective reconstruction. The exhibition is cautious of forms that neutralize the present and obstruct engagement with the image, challenging sterile formats that emphasize documentary and material aspects of photography. Instead, it explores images from new perspectives. A photograph’s meaning is not found in its mere representation of reality or truth, but in the discourse it creates at a specific point in time.[4] Rather than erasing the photograph’s potential, the exhibition aims to reproduce it, inviting multiple viewpoints and interpretations.
The “transversality” signaled by the exhibition reflects evolving media theory. Until the late 1970s, photographic representation was often perceived through a black-and-white lens. Black-and-white photos were seen as the essence of photography, revealing reality, while color photos were regarded as artificial or commercial. In contrast, today’s black-and-white photographs, often captured with digital cameras and subjected to retouching, now appear as contrived and processed as color photos once did. Even black-and-white film and prints, developed in darkrooms, seem unnatural within the digital landscape. What was once considered the most direct representation of reality—colorless and devoid of extraneous information—has now become a symbol of artifice. The black-and-white photographs in this exhibition do not merely recall or adhere to historical forms but instead highlight the parallax and intersection of the medium. Contemporary black-and-white photos, disguised as traditional images, may seem anachronistic, but they embody the specificities of the medium in a novel way. The exhibition explores black-and-white photography not as a defunct form but as an ongoing affirmation and extension of the medium. It examines how both past and present forms coexist and how their distinct characteristics are revealed. This approach represents a continuity rather than an apocalyptic end (or in an apocalyptic continuity), considering the virtual and present aspects of the medium simultaneously.
B/W SIGNALS seeks to transcend the binary logic of black and white, moving beyond mere separation. Instead of participating unconditionally in the spectacle of images, it explores their opaque possibilities, challenging the clear outputs that typically prompt judgment and sympathy. Rather than fixating on the conventional questions of authenticity—such as whether a photograph is real or where and how it was taken—the exhibition emphasizes the underlying potential of images. It embraces the opacity inherent in reality, time, and history as an opportunity to contemplate contemporary existence. Photography is recognized here as something often disguised, inconsistent, and subject to questioning. Black-and-white photographs are presented as vivid manifestations of uncertainty. This approach does not blindly accept photography as a representation of truth nor outright deny its potential; instead, it operates in the space between. Hito Steyerl’s concept of “Einbettung”[5] illustrates this uncertainty, suggesting that we are all embedded in reality and that the world of uncertainty reveals more than what is immediately visible. The exhibition interprets photographs as moving between belief and doubt within the urgent context of today’s images. The black-and-white photographs—objects full of questions—are featured as representations of current reality that defy simple measurement or discussion.
GWON Doyeon’s Nocturama (2022) unfolds as a series of chases, encounters, and confrontations. The photographs capture scenes of unusual intersections and crossings: wild dogs in Bukhansan Mountain, Redfoxes in Sobaek Mountain, and a herd of Formosan deer in an abandoned house in Suncheon. The presence of these beings—where they are, what they are doing—provokes curiosity. It’s fascinating to consider entities that seem out of place, yet seeing them in reality feels almost surreal. The objects and locations in GWON’s work possess a blend of the fantastic and the pathological. The incongruity of urban sprawl, interactions between disparate species, abandoned habitats, and unfulfilled aspirations creates a sense of distance and estrangement. The encounters depicted reveal a double irony: a confrontation marked by both antagonism and hybridity. The act of capturing and presenting these images shifts perception and prompts new awakenings.
KEUM Hyewon’s Family Photo (2018) begins with an old family album, from which the artist rephotographs, retouches, and reconstructs images. Drawing from her maternal grandmother’s album—passed from North to South Korea before the Korean War—and her mother’s album from the 60s and 70s, KEUM uses Photoshop to erase the people in these photographs, leaving only the backgrounds, objects, and spaces. This process transforms the photographs into remnants of proof, memorials, and events. In Family Photo, “taking a picture” becomes an act of looking beyond the temporal and spatial frame, shifting focus towards the boundary between record and imagination. Through these empty spaces and photographs of the past, the artist reflects on personal histories, projects herself, and envisions alternate narratives. The photograph ceases to be a mere record or memory but rather becomes a pause, a present moment that has not yet arrived, and a backdrop for imaginative possibilities.
KIM Chunsoo’s Ai-mod q 135 (2024) and Ai-s 105 (2024) delve into the invisible histories of conflicting photographic media. The artist captures AI (Artificial Intelligence) expositions with AI (Automatic Indexing) lenses, a technology once hailed as revolutionary but now largely forgotten. The photographs focus on “thin materials,” such as wrapping paper and tape, found in the corners of the exposition venues, seemingly unrelated to the cutting-edge technology on display. This juxtaposition straddles the line between the need to document facts and the perception of photography as an advanced technological medium. Printed on the exhibition walls like event wrapping paper, the works present only blurry afterimages and optical illusions rather than clear, solid images. As these works will vanish with the exhibition, they embody the paradox of contemporary photography and technology—a futile iteration of both demise and birth, appearing more “thin” than ever.
KIM Taedong’s photographs capture a fleeting moment of the day. When the Sungnyemun Gate Korea’s National Treasure No.1, one of the eight gates in the fortress wall of old Seoul was engulfed in flames, the artist, who happened to pass by, took pictures as if mesmerized by the scene. These images, taken but never printed until now, are shown for the first time in this exhibition. Created amidst shock and chaos, the photographs no longer point to a specific event or object. Instead, they reveal a parallax—a contourless world of smoke oscillating between past and present, constantly overlapping. By presenting these photographs as a series, KIM emphasizes the difficulty of summarizing or dividing the meaning of a specific event or moment. This work invites viewers to reflect on photography’s ambition to capture moments within a broader temporal context, beyond immediate impressions.
KIM Hyoyeon‘s My Western America (2015) delves into the peculiarities of landscape photography and its realization. The artist traveled to the western United States to capture unfamiliar landscapes, only to encounter vistas that she had already seen in Hollywood films and mass media. This journey, intended to escape familiarity, instead evokes a sense of recoil or awkwardness as an image-photograph transitions into a real-photograph. This uncanny performance of familiarity is reflected in the work, which resembles an ordinary “black and white landscape photograph.” The images appear as though they have been digitally filtered, whitened, and printed in a virtual space, rather than representing a tangible reality. Installed like large billboards in the exhibition space’s front yard, the work transforms into a spectacle—a backdrop that amplifies the sense of fake familiarity and unfamiliarity, creating an optical illusion.
NOH Suntag’s Ambiguous Glues #BJI1500 is a series depicting silhouettes of opposition party leaders from the back as they stand on a podium at Daehak-ro, Jongno-gu. These once-vivid figures, captured during intense debates and arguments, now appear in the exhibition as mere black-and-white outlines. The blurred silhouettes, set against a backdrop of vicious counterarguments and the promotion of unfounded division and hatred, highlight the futility and superficiality of extreme thinking and heated debate. The speech scene, visualized through silhouettes, black and white, and layering, reimagines these figures not as immortal heroes but as “ambiguous glue”—entities connecting and separating in a mutable and unstable relationship.
LEE Hyunmoo’s Still Life (2012-) series may initially seem like a collection of faded, banal still life photographs. However, the artist uses this apparent banality as a means of resetting perception. The work involves photographing the empty spaces behind objects, the objects themselves suspended in air, and their shadows separately, then superimposing these images into a single composition. These seemingly ordinary still life compositions reveal subtle incongruities, such as the separation between objects and their shadows, prompting viewers to reconsider familiar and overlooked everyday items. By exploring the ontological questions of photography—capturing reality as an image—the series deconstructs the objectivity of perception, thought, and experience. Displayed throughout the exhibition as small, thin, and somewhat precariously positioned fragments, the photographs highlight the gap between abstraction and materiality.
HONG Jiyoung’s Dark Room (2024) series traverses a sequence of days and moments. In this work, the lesbian couple, their friends and colleagues, and the places and events that accompany them become intricately connected with the artist’s daily life. At a time when photography is often seen as unable to capture the essence of life or forge connections, HONG reaffirms the potential for photography to maintain a bond with moments and subjects that are inseparable from herself. The artist describes photography as a “diary”—a record of present practice, akin to collecting images in a dark room and writing on a white sheet of paper. This approach captures scenes that lie between or beyond personal and historical experiences and conventions. The scenes and subjects of today, though sometimes obscured, marginalized, or questioned, are transformed into a unique portrayal of the present, encountered rather than confined to extraordinary surprises.
HONG Jin-hwon’s series Melting Ice Cream – index (2024) features photographs of restored, water-damaged film from the 1980s democratic uprisings in Korea, open-source footage of American soldiers hunting during the Korean War, and images of the 1986 Space Shuttle Challenger disaster. These photographs which were not taken by the artist reveal a shift in perception that maintains the ontological validity of documentary photography through the act of witnessing and reproducing events. In HONG’s practice, the illusion of synchronizing scenes with reality is replaced by the restoration, mutation, and transfer of inherently unstable and dissolving images. This approach goes beyond conventional representation, reexamining the notion of the heroic photograph/image and seeking a new phase. The artist presents photography as a self-reflexive practice, liberated from isolation and paralysis.
HWANG Yezoi presents six portraits that transcend simple depiction. Instead of merely indicating “You” or stating “You look like this,” these portraits become events or revelations, blending various symbols. HWANG’s approach is more flexible than rigid. The “young males” depicted straddle the line between gender, sexual orientation, generation, and group, suggesting a continuity with the subjects from the artist’s earlier “female portraits.” These photographs explore and re-symbolize nuanced specifics that go beyond conventional male portraiture. In an era when being photographed often feels like a chore rather than a privilege, the artist invites viewers to see portraiture as a state of self-projection, pleasure, or disorientation, uncovering a more intimate sense of “you,” “me,” or “us.”
KWON Hyukgue (Chief-Curator, Museumhead)
[1] Georges Didi-Huberman, in Survival of the Fireflies (translated by Lia Swope Mitchell, Univ. of Minnesota Press, 2018), speaks not of searchlights or billboards but of faintly glowing images. He discusses the power of imagery to redeem devalued experiences.
[2] Roland Barthes explores the existential state of photography through the Latin term “interfuit,” which refers to the dual state of being in which the object seen in a photograph was once present (ça-a-été) but is no longer there. For more on this concept, see Roland Barthes, La Chambre Claire (1980), pp. 120-121.
[3]André Bazin, in his “Ontologie de l’image Photographique” (1945-48), defends photography as a medium that achieves a “complete fulfillment” of the goals of “realism” and “representation.” In contrast, Roland Barthes begins his exploration with “those photographs which I was convinced existed for me” as his starting point.
[4] See, John Tagg, The Disciplinary Frame: Photographic Truths and the Capture of Meaning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9).
[5] Hito Steyerl (trans. AHN Kyuchul), The Color of Truth: Documentary in Art (Workroom Press, 2019), pp. 13-15; originally in German as Die Farbe der Wahrheit: Dokumentarismen im Kunstfeld (Turia + Kant, 2018).